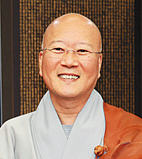〈16〉간화선의 활구(活句)
활구 의심이 간화선의 생명이다
|
|
‘정신적인 벽’에 꽉 막힌 학인이
그 벽을 타파하도록 이끄는 것이
선지식 역할…간화선의 올바른 길
간화선 수행을 바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화두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나중에 상기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간화선을 가르치는 사람도 화두가 들릴 수밖에 없는 장치를 시설할 줄 알아야 하고, 배우는 사람도 선지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시키는대로 빈틈없이 수행할 발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조사선 시대에는 학인이 근본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을 때, 선지식을 찾아서 묻는 것을 공부로 삼았다. 명안종사는 간절히 물어오는 학인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직지인심(直指人心)하여 근본당처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때 줄탁동시(啐啄同時)하여 언하에 깨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학인이 여기서 계합하지 못하면 그 심정은 마치 ‘내린 눈 위에 서리 더하듯, 타는 불에 기름 붓듯,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
더욱 답답하고 사무치게 된다. 이것이 지속되어 익어가다가, 기연(機緣)을 만나 마침내 돈오(頓悟)하게 되는 것이 조사선 시대의 공부법이었다.
이런 공부법은 학인이 스스로 진리에 대해 의심을 일으켰을 때 가능한 방편이다.
하지만 승속을 불문하고 출세간의 불이법(不二法)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자, 마침내 간화선 수행법이 등장했다. 간화선은 화두를 참구하는
공부법이다. 화두는 공안 상에서 일어난 의심이다.
조사선이든 간화선이든 그 원리는 동일한데, 근본에 대해 의심이 일어나서 그것이 한 덩어리로 뭉쳐 마침내 터지면서 깨달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조사선은 학인 스스로가 의심이 일어나서 선지식을 찾아가 묻기도 했고 선지식이 의심을 하게끔 이끌기도 했지만, 간화선은 선지식이 학인에게 의심을
걸어준다는 점이 다르다. 학인이 선지식에게 화두를 요청했을 때, 선지식은 학인이 보는 앞에서 바로 화두를 의심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실한지 점검해준다. 여기서 제대로 의심하게 되었으면, 학인은 정신적인 벽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달마가 면벽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벽을 보고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질적인 벽은 정신적인 벽이다. 누구나 역대 조사께서 밀밀히 전해주신 이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면, 선지식이 지금
눈앞에서 빤히 제시하는 ‘공개된 비밀’을 알지 못해 의심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이 하는 것인가?”
모든 화두가 이와 같다. 간화선의 활구(活句)란 학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꽉 막혀서 의심이 사무치게 일어나게 만드는 장치를 말한다. 선지식은
이렇게 학인에게 정신적인 벽을 시설할 수 있어야, 바른 공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만일 여기서 학인이 벽을 외면하고 머리로 이런저런 궁리만
한다면, 그것은 조작일 뿐 공부가 전혀 시작도 안 된 것이다. 따라서 학인이 선지식에게 화두를 타 와서 스스로 참구해서는 그냥 뱅뱅 돌기만 할
뿐 활구 화두를 들기 어렵고, 가르치는 사람도 화두만 던져주고 돌려보내서 혼자 참구하게 해서는 무책임한 것이다.
요점은 의심이 잡혀져 경계가 수용되는 것이 화두인데, 의심도 안 잡히면서 어떻게 경계가 생기겠는가 하는 점이다. 선지식은 처음부터 꽉
막히게 활구 화두를 걸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옆에서 호법을 서주면서 고비 고비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가닥을 쳐주어야 한다. 학인이
혼자서는 경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식이 학인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눈앞의 정신적 벽을 뚫고나가 타파하도록 독려해서 이끄는 것이 간화선의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바른
지도하에 공부한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정신적인 벽을 뚫어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수불스님 | 안국선원 선원장
[불교신문 2016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