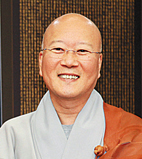〈78〉안목 바뀐 납자 의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22. 종각선인(宗覺禪人)에게 주는 글
|
|
보리심 낸 학인 중생심 벗어나도록
번뇌망상 철저히 빼앗아버리는 것도
눈 밝은 선지식의 ‘진정한 자비’…
본문: 종문(宗門)에서는 날카로운 지혜를 가진 최상근기로서 생사를 벗어나고 지견을 끊으며, 언설을 여의고 성인과 범부를 초월하는 오묘한
도를 가진 자를 제접한다. 그러니 어찌 천박하고 좁은 식견을 가지고 도리를 따지거나 기연·경계 등의 알음알이 위에서 살 궁리를 하는 자가 헤아릴
수 있으랴.
해설: 선문은 눈 밝은 선지식들을 중심으로 용상(龍象) 대덕들이 모인 곳이다. 안목을 갖춘 도인이 오면 최상의 대접을 받겠지만, 어리석은
자가 오면 발붙일 곳이 없다. 종사들의 안심입명처는 빼어난 안목을 구축한 사람들만이 이 일단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천박한 눈으로는 엿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내외가 명철하여 절학무위(絶學無爲)한 한가한 도인은 범부와 성인을 함께 초탈하고 언설과 지견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얕은 경계를 법으로 알고 붙잡고 있는 이들이나 건해지(乾解知)를 공부로 삼고 있는 이들은 감히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멸한 근본당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본문: 반드시 용과 호랑이처럼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를 요한다.
해설: 여기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법을 물으러 온 학인이 나름대로 애지중지 매달리고 있는 경계나 알음알이를 빼앗는 것을 말하며,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그 뒤에 반야지혜를 눈뜨도록 전환해주는 살활자재(殺活自在)한 법력(法力)을 말한다.
눈 밝은 선지식의 진정한 자비란 보리심을 낸 학인으로 하여금 영겁토록 갇혀있던 무명업장의 중생심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어서, 상대의 어리석은 집착과 번뇌망상을 철저히 짓밟아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밭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거지의 밥통을 차버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본문: 그들은 재빠르고 날카로운 역량을 써서, 거량하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바로 떨치고 일어나 떠나버린다.
해설: <치문경훈>에 이르기를, “그대가 이미 장부면 나도 그렇다. 어찌 스스로 가볍게 여겨 뒷걸음질 칠 것인가(彼旣丈夫我亦爾
何得自輕而退屈)”라고 하였다. 또한 구봉도건의 법을 이은 동안상찰(?~961) 선사의 <십현담>에는 “장부는 하늘을 찌르는 기개가 있기에, 여래가 가신 길이라 해서 따라가지 않는다(丈夫自有衝天志 不向如來行處行)”고 했다.
<금강경>에 정통하여 ‘주금강(周金剛)’이라 불리던 덕산선감(782~865)스님이 용담숭신의 법을 이은 후 당시 큰 회상을 이루고 있던 위산으로 갔다. 법당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면서 방장을 돌아보았는데, 위산스님은 말이 없었다. 그러자 덕산스님이 말했다.
“없구나, 없어.” 그리고는 뛰쳐나와 승당 앞에서 말하기를 “비록 그렇더라도 경솔할 수는 없구나”라고 한 뒤에 위의를 갖추고 다시 찾아뵈었다. 덕산스님은 문턱을 들어서자마자 좌복을 번쩍 들면서 말했다.
“화상!”
위산스님이 불자를 잡으려 하자, 덕산스님은 ‘할’을 하고는 뛰쳐나와 그대로 떠났다. 저녁이 되자 위산스님이 대중에게 물었다.
“오늘 새로 온 스님이 어디에 있는가?”
대중이 대답했다.
“그 스님은 화상을 뵙고 나서 다시 승당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스님이 누구인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가 뒷날에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부처도 조사도 모두 꾸짖어 버릴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목이 바뀐 납자의 의지를 누구라도 엿보거나 꺾을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다.
수불스님 |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불교신문 2015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