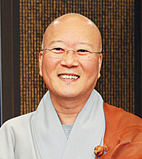〈76〉“의식적인 말 한마디는 만겁의 나귀 매는 말뚝”
21. 일서기(一書記)에게 주는 글
|
|
‘발밑이 보광명장, 목전이 법공 자리’
진정한 무애자재는 배운 것이 아니라
본래 지니고 있는 ‘자가보장’서 나와
본문: 가리어졌던 것을 드러내어서 어두운 방에 밝은 등불을 켜고 나루터에서 배가 되고자 한다면, 큰 해탈을 증득하여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단박에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해설: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맑고 고요하며 깨끗한 자리에서 홀연히 한 생각 일어나는 순간, 자기 본래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장치되어진 수단 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야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나루터에서 배가 된’ 대표적인 선지식으로는 당대(唐代)에 청원행사의 문하로 약산유엄의 법을 이은 선자덕성(船子德誠) 선사가 있다.
선자스님은 소주(蘇州) 화정 오강(吳江)에서 작은 배를 저어 사람들을 건네주었기에 ‘뱃사공(船子) 화상’이라 하였다. 선자스님은 사제인
천황도오에게 후일 영리한 후학이 있거든 한 명 보내달라고 하였다. 몇 년 뒤에 천황스님은 협산선회(夾山善會)를 선자스님에게 보냈다. 선자스님이
선회에게 물었다.
“좌주는 어느 절에 머무시는가?” 선회가 말했다.
“절이라면 곧 머물지 않음이요, 머문다면 절이 아닙니다.”
“어째서 머무르지 않는가?”
“눈앞에 절이 없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인가?”
“귀와 눈이 이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선자스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한마디 의식적인 말(頭意)은 만겁의 나귀 매는 말뚝이로다. 천척의 실을 드리움은 그 뜻이 깊은 못에 있으니, 세 치 혀를 여의고 속히
말하라, 속히 말하라.”
선회가 입을 열려고 하자, 선자스님이 삿대로 밀어서 물속에 빠트려 버렸는데, 선회는 이로 인해 크게 깨달았다. 선자스님은 그 후에 배를
버리고 자취를 감추었다고 전한다.
본문: 진리(理)에 들어가는 문을 통달하고 그런 뒤에 보광명장(普光明場)에 올라 번뇌 없는 청정한, 그리고 수승하고 위대한 법공(法空)의
자리에 앉는다.
해설: ‘보광명장’이라고 해서 어디 따로 정해진 모습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實相)을 눈 연 공부인이라면 언제나 본분 자리를
여의지 않는 법이다. 임제스님이 ‘어디서나 주인이 되면 선 곳이 다 참되다(隨處作主 立處皆眞)’라고 말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딛고 선
발밑(脚下)이 그대로 보광명장이요 목전(目前)이 그대로 법공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본문: 바다 같은 입에서는 물결이 출렁이듯 ‘네 가지 걸림 없는 변재(四無碍辯)’를 떨친다. 한 기연을 세우고 한 마디를 내려 주며 한
수승한 모습을 나타내어 널리 범부 · 성인 · 유정 · 무정들이 모두 위엄스러운 광채를 우러러보며 은혜를 입게 하여도, 이는 아직 절승한 공훈의
상태는 아니다.
해설: 사무애변은 사무애지(智) 혹은 사무애해(解)라고도 하는데, 입으로 나올 때는 변(辯)이라고 하고, 마음에 있을 때는 ‘지’나
‘해’라고 한다. 첫 번째 법(法)무애는 온갖 교법에 통달한 것이고, 두 번째 의(義)무애는 온갖 교법의 요의(要義)를 아는 것이며, 세 번째
사(辭)무애는 여러 가지 수사(修辭)를 막힘없이 구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요설(樂說)무애는 온갖 교법을 상대가 듣기 좋아하도록 자재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치와 변재가 무애자재하게 되었더라도, 아직은 구경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무애자재 법은 밖에서 배워
얻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자가보장(自家寶藏)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수불스님 |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불교신문 2015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