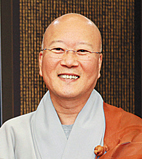〈71〉‘죽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경계’ 일러주다
19. 고선인(杲禪人)에게 주는 글
|
|
“세간 버리고 출세간에 머무르려는 것은
세간 따로 출세간 따로인 조각난 공부”
본문: 그의 내력을 살펴보았더니, 부공(傅公, 장무진공)의 집에서 그를 선발해준 것이 애초의 원인이었다. 이윽고 심한 추위를 무릅쓰고 잠깐
함평(咸平) 땅으로 가려고 나를 찾아왔다. 떠날 것을 알리며 법어를 청하기에 나는 그에게 법어를 내렸다.
해설: 원오극근 선사는 이 편지를 통하여, 대혜종고스님이 비록 돈오의 체험은 했지만 아직 고요한 곳에 머물러 있기만 하고 활발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 공부길을 지시해주고 있다. 대개 돈오를 체험하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단박에 내려놓은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시원하고 가벼운 경계에 천착하게 된다. 세간의 고해에서 살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출세간의 해방감을 맛보면, 그것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아직 세간 따로 출세간 따로인 조각난 공부다. 고요하고 일없는 데 안주하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바로 조사들이 경책하던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경계’로서, 이때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여 크게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다.
본문: 납자라면 의당 통렬하게 생사로써 일을 삼고 지견과 알음알이의 장애를 녹이도록 힘써서, 불조가 전수하고 부촉해주신 큰 인연을 철저하게
깨쳐야 하리라.
해설: 일반적으로 돈오를 통해 ‘공(空)’을 체험하더라도, 아직은 ‘상(相)’이 남아있어서 그 공을 하나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면 색을 버리고 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중도실상(中道實相)에 계합하지 못하여 생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능엄경>에서 “이치는 몰록 깨달을 수 있으나, 실제 일은 몰록 제거하지 못한다(理卽頓悟 事非頓除)”고 하여, 돈오 후 습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원오극근 선사는 이 경계에 걸려있는 대혜스님에게 지견과 알음알이의 장애를 녹여서 불조가 이심전심으로
전해주신 생사일대사를 철저히 깨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은 물론 깨달음까지도
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무명도 없애야 하지만,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애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이나 법에 대한 지견과 알음알이를 철저히 녹여
없애야만, 비로소 생멸의 이법(二法)에서 벗어나 불생불멸의 불이법(不二法)에 계합하고 생사일대사를 말끔히 해결해 마칠 수 있는 것이다.
본문: 이름나기를 좋아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실다움을 구해 수행과 이해 그리고 도와 덕에 충실해야 한다. 숨으면 숨을수록 숨겨지지가 않아
모든 성인과 천룡이 그를 사람들에게 밀쳐 내리라. 그런데 하물며 세월에 묻혀 단련하고 탁마하며 기다리니, 마치 종소리가 치는 대로 울리듯,
골짜기에 메아리 울리듯, 대장장이의 천만번 풀무질과 담금질 속에서 나온 진금이 만세토록 변치 않듯, 만 년이 일념인 경지야 말해
무엇하랴.
해설: 생멸심을 철저히 조복받기 위해서는 나서서 이름나기를 좋아하지 말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마음을 각찰하고 방하착(放下着)하여 실다움에
충실해야 한다. 거울을 만들려면 오랫동안 구리덩어리를 두들겨 평평하게 편 뒤에 거친 것을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스스로 비출 정도로 맑아지면,
마침내 내외를 명철(明徹)하게 비출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오랜 정진의 힘이 마침내 흘러넘치게 되면, 아무리 송곳을 주머니 속에 감추려고
해도 때가 되면 밖으로 삐져나오듯이 시절인연 따라 세상 밖으로 나와 보살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수불스님 |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불교신문 2015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