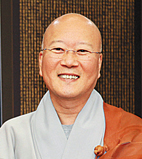마음은 형상이 없는데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니?
〈50〉12. 보현사(普賢寺) 문장로(文長老)에게 드리는 글
|
|
본문: 부처와 조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였는데, 대개 모두는 투철하게 깨달아 벗어나서 마치 두 거울이 서로 비추듯 언어나 형상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격식과 헤아림을 멀리 초월하여 화살과 칼끝이 서로 마주 버티듯, 애초에 다른 인연이 없어야만 도의 오묘함을 전수받아 조사의 법등을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알음알이가 끊겨 사유를 벗어나고 정식(情識)을 뛰어넘어서 호호탕탕하게 통하여 자유자재한 곳에 도달하였습니다.
해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다는 것은 참 묘한 말이다. 마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근거가 없어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과거·현재·미래에 관계없이 꽉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실로 그 형상이 없어서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억지로 이름 하여 ‘마음’이라고 했을 뿐인데, 불조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을 말한 것일까? 직접 깨달아봐야만 그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이 근본 입장이 없다면, 불법이나 불교는 성립할 수가 없다.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심전심이라고 했는지 온몸으로 은산철벽을 타파하고 직접 그 실상을 밝혀내야만 비로소 모든 의구심이 사라질 것이다.
비유하면 맑은 거울을 놓고 서로 비추면, 다만 투명할 뿐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처럼, 그 어떤 모양도 없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름 하여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툭 터져서 사통팔달로 뚫려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자유자재’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조차 없다. 이쪽도 저쪽도 없는데, ‘자유자재’가 어떻게 성립할 것인가.
늘 그 속의 일이어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방편으로 ‘자유자재’라는 표현을 열어놓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가사의하고 오묘하기 짝이 없는 근본실상을 수용하여 소화시키고 또 남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비로소 수천 년을 이어온 법등(法燈)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쪽저쪽도 없으니 ‘자유자재’도 헛말
오묘한 이 진리를 밝혀줄 자 누구인가
본문: 사람을 택하여 법을 부촉할 경우에 이르러서는 남다른 기상은 물론 모습이나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런 뒤에야 집안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단을 체득하여야 바야흐로 서로가 부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을 계속 이어오면서 갈수록 더욱 빛이 났으니, 이른바 근원이 깊어야 멀리까지 흐른다고 한 것입니다.
해설: 육조혜능스님이나 대혜종고스님은 수천 명의 사부대중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전해오지만, 그 중에서 법을 감당할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성품을 밝혀 자신의 생사대사를 해결하는데서 나아가, 제접하는 학인의 정식을 끊어주는 장치를 시설하고 끝내 정신적인 벽을 허물 수 있도록 호법을 서주는 방편지(方便智)까지 갖추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문: 요즘은 자못 옛날의 자취를 잃어 가풍을 함부로 하며 주장들을 남기고 격식을 만듭니다. 스스로도 완전히 벗어나질 못하고서 도리어 남들을 위한다면, 이것은 마치 늙은 쥐가 소뿔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점점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위대한 강령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설: 엄밀하게 전해오는 전통적인 가풍을 소홀히 하고, 헛된 주장이나 쓸데없는 형식을 새로 만들어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방편에 나가떨어져서, 허공 같이 텅 빈 당처에 말뚝을 박는 것처럼 허망한 일인 것이다.
그 이유는 스스로 확철하게 공부를 해마치기도 전에, 남을 위한답시고 조급하게 가르치려고 들었기 때문이다. 자질구레한 절차와 단계를 훌쩍 뛰어넘고 몸소 훤칠한 안목을 갖추신 대종장을 찾아뵙고 자세한 지도와 점검을 받은 후에, 법 쓰는 법을 살필 수 있어야 비로소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불스님 |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불교신문 2015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