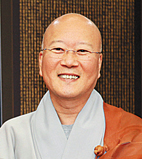도인 모습은 물에 뜬 호로병 같아
〈48〉10. 보령(報寧)의 정장로(靜長老)에게 드리는 글
|
|
본문: 현묘한 이성(理性)을 가지고 눈썹을 드날리며 눈을 깜박이고, 손을 들고 다리를 움직이는 사이에 그럴 듯한 해석을 하며 실답지 못한 법으로 세상의 남녀를 얽어 묶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한 봉사가 여러 봉사를 이끄는 것과 같으니, 어찌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해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어오면 눈을 깜박이고,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불법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면 “할!”을 하는 등 머리로 이치를 헤아려 그럴 듯한 언행으로 흉내 내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옛사람들이 하던 모습을 익혀서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에 늘 쓰고 있는 이것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하고 따라하면, 그것은 망상일 뿐으로 마치 봉사가 다른 봉사들을 이끌고 절벽에서 함께 떨어지는 어리석은 꼴과 같아서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것이다.
본문: 이미 지위에 앉아 종사라 불리는 사람은 참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분에 맞게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고고하고 준엄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사자가 노닐 때 그 의기가 뭇 짐승을 놀라게 하듯, 나왔다 들어갔다 사로잡았다 놓았다 함을 끝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땅에 웅크리고 앉아 반대로 몸을 돌리면 모든 짐승이 달아나면서 겁을 집어먹으니, 어찌 수승하고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물결 고요하든 사납든 가리지 않고
흐름 따라 부침하며 항상 여여하다
해설: 골수에 사무친 안타까움을 직접 맛본 끝에 마침내 은산철벽을 무너뜨리고 내외가 명철해진 선지식이라면, 법을 물어오는 상대방이 ‘어디에 막혀있는지? 뭘 원하는지? 뭣 때문에 저렇게 답답해하고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뭣 때문에 고민하는지?’ 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하게 믿음을 내게 한 후에, 안목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어야 한다. 눈 밝은 선지식이라면 사자후(獅子吼)를 토하여, 그 어떠한 희론(戱論)이라도 단박에 꺾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문: 이러한 사람이라면 3000리 밖에서도 이미 일의 단서를 모두 살핍니다. 그래서 암두스님은 말하기를, “물 위에서 호로병을 누르는 것과도 같아 무심하여 호호탕탕한 경지는 억지로 잡아당겨 얽어매려 해도 되지 않고, 부딪치고 누르는 대로 천지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잘 기르고 실천하여 이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영산·소실과 함께 한 가닥 길을 나눈다 하겠습니다.
해설: 법을 물어오는 학인은 아직 생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거지나 입을 열 때, 스스로 어디가 막혀있는지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눈 밝은 선지식은 이러한 때를 놓치지 말고 즉각 민첩한 기봉으로 응해서, 막힌 곳에 전광석화처럼 침을 놓아 주어야하는 것이다. 도인의 모습은 마치 물 위에 뜬 호로병과 같아서, 어떤 인연이 닥쳐도 눌러지지 않고 둥둥 떠 있게 된다.
흐름이 고요하면 호로병도 고요히 떠있고, 파도치면 치는 대로 오르내린다. 호로병은 물결이 고요한지 사나운지 가리질 않고, 다만 흐름 따라 부침하면서 항상 여여한 것이다. 이렇게 무심하게 인연 따라 임운등등(任運騰騰)하게 흘러가는 것이 도인의 행리처다. 마치 영산회상의 부처님이나 소실봉의 달마대사가 가신 길을 묵묵히 뒤따르는 것이 아닐는지….
본문: 황벽·임제·암두·설봉 등의 스님은 서로 빈(賓)·주(主)가 되어,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듯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온 것을 헛되게 하지 않고 20년, 30년 법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집안에는 같이 흐르고 함께 증명하여 통달한 사람이 저마다 있어서, 서로서로 보호하였습니다.
해설: 당대(唐代) 8~9세기에는 중국 강서성과 호남성을 중심으로 사방에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주석하고 있어서, 참으로 강호제현(江湖諸賢)의 교류가 빈번하였다.사제(師弟)간인 황벽과 임제, 위산과 앙산, 동산과 조산, 덕산과 암두·설봉 등의 용상(龍象)들이 도처에 깔려 서로 ‘주인(主)’이 되고 ‘손님(賓)’이 되어서 종횡무진 문답을 주고받으며 불법을 천하에 증명하고 널리 홍포했으니 참으로 ‘선의 황금시대’를 연다.
수불스님 |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불교신문 2015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