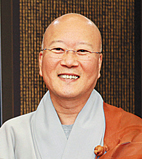허공 같은 성품인데 무엇을 세우랴
〈44〉9. 고서기(杲書記)에게 주는 글
|
|
본문: 많은 납자들이 제 나름대로 분별 설명을 하였으나, “우리 법왕의 창고 속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고 한 것을 사뭇 몰랐다 하리라. 희롱하여 가지고 나오면 보는 자들은 그저 눈만 껌벅거릴 뿐이니, 모름지기 저 빼어난 이들은 계합 증오하여 시험과 인정을 받아 때로는 정면으로 때로는 측면으로 제접하며 본분의 수단을 쓰거니, 어찌 일정한 단계와 매체를 빌리랴.
해설: 임제스님이 학인들을 가르칠 때 방편으로 ‘3현 3요’ 등의 말씀을 하신 것을 가지고, 후에 많은 이들이 나름대로 분별하여 설명하곤 했지만, 그 어떤 해석도 결국엔 사족(蛇足)에 불과해서, 눈 밝은 이는 즉각 계합하여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우리 법왕의 창고 속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는 말은 <대반열반경>에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법에 대한 중생의 분별망상을 끊어주기 위해 하신 비유이다. 법왕의 창고는 허공 같은 성품을 말하는데, 거기에 어떤 칼이 있을 리가 없다. 허공에 뭐라도 세운다면, 그것은 즉각 토끼뿔 같은 허구가 되고 만다.
눈 밝은 선지식이 때에 당해 방편으로 마음자리를 드러낼 때, 모르는 이는 그저 눈만 껌벅거리겠지만 만일 빼어난 제자라면 즉시에 이심전심으로 계합할 것이다. 그 후 세월 따라 습기를 잘 다스리고 난 후에는, 스승 못지않게 본분의 수단을 무애자재로 사용하여 인연 있는 사람에게 공부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 어떤 해석도 결국엔 사족 같은 것
단계 거치지 않고 본분수단 바로 쓴다
본문: 보수(寶壽)스님이 개당할 때 삼성(三聖)스님이 어떤 한 스님을 밀어내자 보수스님은 갑자기 후려쳤다. 그러자 삼성스님은 말하기를, “그대가 이와 같이 사람을 대한다면 이 스님만 눈멀게 할뿐 아니라, 진주(鎭州)땅 온 성안 사람들의 눈까지 모두 멀게 하고 말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보수스님은 주장자를 던져버리고 곧바로 방장실로 되돌아가버렸다.
해설: 원오스님은 제자인 대혜스님에게 명안종사가 단계와 매체를 빌리지 않고, 본분수단으로 바로 학인을 제접하는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보수개당(開堂)’ 공안이다.
법안문익(885~958)이 제자들에게 보수스님과 삼성스님의 일화를 제시하면서, “어디가 남의 눈을 멀게 한 곳인가?” 하고 물었다는 기록이 <선문염송> 제1164칙에 전해온다.
삼성혜연(?~867)은 스승의 어록인 <임제록>을 편집한 스님인데, 진주의 보수스님이 개당설법을 할 때, 이렇게 한바탕 연출을 하면서 축하해주었다는 것이다. 위산철(潙山喆)스님이 염(拈)하기를, “보수는 흡사 나라 안에서 천자의 조칙이 바야흐로 시행된 것과 같고, 삼성은 국경에서 장군의 법령이 떨어진 것과 같다”고 말했다.
원오스님은 이 공안에 대해 이렇게 염했다. “보수는 흡사 독룡이 바다를 뒤집으니 비가 동이물을 쏟는 듯하고, 삼성은 비록 우레가 푸른 하늘에서 떨치나 아직 무서운 빛을 반도 도와주지 못함과 같다. 그 가운데 바로 알아듣는 이 있다면, 다만 진주 성안 사람들의 눈만 멀게 할 뿐 아니라 천하 사람들의 눈도 멀게 하리라.”
본문: 흥화스님이 함께 참학하던 스님이 찾아오는 것을 보더니 문득 ‘할’을 하자 그 스님도 할하였고, 흥화스님이 또 ‘할’하자 그 스님도 다시 ‘할’하였다. 흥화스님이 다가가서 방망이를 드니 그 스님이 또 ‘할’을 하거늘, 흥화스님은 “보아라, 이 눈 먼 놈아!”라고 하고 곧바로 후려치며 법당에서 쫓아내버렸다.
시자 스님이 “그 스님에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요?”라고 묻자 흥화스님은 말하였다. “그가 할을 할 때는 방편(權)도 있고 진실(實)도 있더니, 내가 손을 들었을 때는 그가 결코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처럼 눈 먼 놈을 때리지 않고 어찌하겠느냐.”
해설: 원오스님은 다시 한 번 활발발하고 전광석화 같은 임제정종의 가풍을 소개하고 있다. 원오스님은 선문염송 제760칙에서 이 공안을 이렇게 염했다. “번갯불도 흥화의 빠름에 비교할 수 없고, 울리는 우레도 그의 위엄에 비교될 수 없다. 가히 밭을 가는 농부의 소를 잘 빼앗고, 배고픈 사람의 밥통을 잘 빼앗는다고 하겠다. (…) 그런데 흥화가 손을 들었던 곳은 어디인가?”
수불스님 |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불교신문 2015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