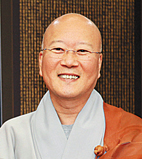원오선사가 제자 대혜에게 전한 내용은?
〈43〉9. 고서기(杲書記)에게 주는 글
|
|
본문: 임제의 정종(正宗)은 마조(馬祖)스님과 황벽(黃蘗)스님으로부터 대기(大機)를 드날리고 대용(大用)을 발휘하였다. 그물을 벗어버리고 소굴을 벗어나 호랑이와 용처럼 달리며 별똥 튀고 번개가 부딪치듯 하여서, 오므렸다 폈다 잡았다 놓았다 하는 이 모두가 본분(本分)에 의거하여 면면적적(綿綿的的) 하였다.
해설: 원오 극근스님이 남송대(南宋代) 1137년경 항주(杭州) 경산사(徑山寺) 능인선원에 머물던 제자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스님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원오스님은 이 서신을 통해 임제종의 근원인 마조 도일(709~788) 선사와 임제의 스승 황벽 희운(?~850) 선사의 대기대용을 찬탄하며 소개하고 있다.
이분들은 사량 분별을 떠난 원숙한 경지에서 반야지혜를 활달하게 운용하여, 천만사리(千萬事理)를 거침없이 처리하고 살활자재(殺活自在)한 기량으로 수행자들을 지도하였던 바, 이 점을 자세히 살피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사자가 문턱에 앉아 물어 뜯어 죽이는데
하늘 치솟는 기개 높은 종장 우글거리네
본문: 풍혈(風穴)스님과 흥화(興化)스님에 이르러선 종풍을 더욱 높이 드날리고 기봉은 더욱 준엄하였다. 서하(西河)스님은 사자를 희롱하였고 상화(霜華)스님은 금강왕(보검)을 떨쳤는데, 종문(宗門)의 문지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인가를 직접 받지 않고서는 그 규모를 알 수 없으며 부질없이 스스로 껍데기만 더듬는다면 희론만 더할 뿐이다.
해설: 임제스님의 법은 흥화 존장(830~888), 남원 혜옹을 통해 풍혈 연소(896~973)로 이어지고, 이 법은 다시 수산 성념, 분양 선소를 통해 석상 초원에게 이어졌다. 석상스님 아래에서 양기파와 황룡파가 갈라져서, 양기스님 아래에서 백운 수단, 오조 법연(1024~1104)을 이어 원오 극근스님이 나온 것이다.
분양 선소(947~1024)스님은 말하기를, “분양의 문하에는 서하의 사자가 문턱에 앉아,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물어뜯어 죽인다. 어떤 방편을 써야 분양의 문안에 들어와서 분양의 사람됨을 보리오?” 하였다. 분양 선소의 제자 석상 초원(986~1040)스님은 호남성 석상산(石霜山) 숭승사(崇勝寺)에서 교화를 펼쳤다.
석상산은 일명 석화산(石華山)이라고도 하는데, 상화(霜華)스님은 석상초원을 말한다. 석상스님은 학인의 분별망상을 가차 없이 베어버리는 금강왕보검을 휘둘러 그 선풍이 준엄하기로 유명하였는데, 그 문하에서 양기 방회, 황룡 혜남, 취암 가진, 도오 오진 등의 선사들이 배출되어 문중이 매우 번창하였다.
본문: 대체로 하늘을 치솟는 기개를 가지고 격식 밖의 도리를 받아 지니고 싸우지 않고도 백성과 군사를 굴복시키며, 살인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해도 오히려 본분의 취지와는 비슷하지도 못한데, 하물며 별을 옮기고 북극성을 바꾸며 천륜(天輪)을 굴리고 지축(地軸)을 돌리는 경우이겠느냐. 그러므로 삼현삼요(三玄三要)와 사료간(四料簡) 등 많은 까다로운 언구(絡索)들을 보여주었다.
해설: 원오스님은 대혜스님에게 천하 선림의 5가7종 중에서도 특히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사자후로 유명한 임제종 대종장들의 법 쓰는 법을 소개하면서, 특히 임제의현 선사가 천하납자들을 지도하던 방편교설을 일러주고 있다.
임제스님은 말하기를, “일구(一句)의 말에는 삼현문(三玄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일현문(一玄門)에는 삼요(三要)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방편(權)도 작용(用)도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였다.
여기서 ‘삼현’이란 ‘체중현(體中玄)’ · ‘구중현(句中玄)’ · ‘현중현(玄中玄)’이다. ‘삼요(三要)’란 ‘대기원응(大機圓應)’ · ‘대용전창(大用全彰)’ · ‘기용제시(機用齊施)’를 말한다.
또한 임제스님은 학인을 제접하는 방편인 ‘사료간’에 대해 “나는 어떤 때는 사람을 빼앗지만 경계는 빼앗지 않고(奪人不奪境), 어떤 때에는 경계를 빼앗지만 사람은 빼앗지 않으며(奪境不奪人), 어떤 때에는 사람과 경계를 함께 다 빼앗고(人境兩俱奪), 어떤 때에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다 빼앗지 않는다(人境俱不奪)”고 하였다.
수불스님 |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불교신문 2015년 1월 29일]